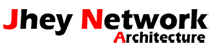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그 말씀이 꼭 옳으십니다. 나는 자식을 낳으면 죽어도, 내 사촌은 아들을 사형제나 두었는데 모두 감기 한 번 아니 앓고 잘 자랍니다.”
“그러하리다. 대원 한 산소는 모르겠소마는 이 두 분상 산소는 시각이 바쁘게 면례를 하여야 하겠소.”
함진해가 임지관의 말에 어떻게 혹하던지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꼭 곧이 들을 만치 되어, 그 다음부터 임지관더러 말을 하자면, 선생님 선생님 하여 극공극경(極恭極敬)하기를 한층 더 심하더라.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같이 박복한 위인을 아시기가 불찰이시올시다. 아무쪼록 불쌍히 보셔서 화패나 다시 없을 자리를 지시하여 주옵소서.”
“글쎄요, 무엇을 아나요? 어떻든지 차차 봅시다.”
“이 도곡 안이 과히 좁지는 아니한데 혹 쓸 만한 자리가 없을까요? 좀 살펴보시면 어떨는지요.”
“이 도곡에 산지(山地)가 무엇이오? 벌써 다 보았소. 영감이 산리(山理)를 모르니까 그 말 하기도 쉬우나, 말을 들어 보면 짐작이 나서리다. 대지는 용종요리락(大地龍從腰裡落[대지룡종요리락])하여 여기횡전작성곽(餘氣橫纏作城郭)이라 하니, 큰 자리는 용이 장산 허리에서 뚝 떨어져서 남저지 기운이 가로 둘러 성곽 모양이 된다 하였거늘, 이 산 내맥(來脈)을 볼작시면 뇌두에 성신(星辰)이 없고 본신에 향응(向應)이 없어 늘어진 덩굴도 같고, 족은 지룡도 같으니, 이는 곧 천룡(賤龍)·직룡(直龍)이라, 아무리 속안(俗眼)에는 쓸 만한 듯하여도 기실은 한 곳도 된 데가 없으니 그대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그러면 우리 국내가 진위 땅에도 있습니다. 그리로나 가보실까요?”
“여기니 저기니 할 것 없소. 영감의 정성이 저러하시니 말이오마는, 내가 이왕에 한 자리 보아 둔 곳이 있는데, 웬만하면 아니 내어놓자 하였더니…….”
하며 그 다음 말은 아니하고 우물우물 흉증을 부리니, 남 보기에는 가장 천하명당을 보아 두고 내어놓기를 아까워 주저하는 것 같은지라, 함씨가 궁금증이 나서,
“너무나 감격무지하오이다. 그 자리가 어디오니이까?”
“차차 아시지요. 급하실 것 있소?”
함씨가 임지관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묏자리 일러주기만 바라고 날마다 정성을 들이는데 임지관은 쿨쿨 낮잠만 자고 그대 수작이 일절 없더라.
이때 노파는 무슨 통신을 하는지, 하루 몇 번씩 금방울의 집에 북 나들듯하고, 금방울은 무슨 계교를 꾸미는지 고양 땅에를 삼사 차 오르내리더라.
하루는,
“영감, 산구경 가십시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든지 나 가자는 대로만 가십시다.”
하며 곁의 사람 듣기 알맞을 만하게 혼자말로,
“가보아야 좋기는 좋지마는 좀체 성력(誠力)에 그런 자리를 써볼까?”
함진해는 그 말을 넌짓 듣고 가장 못 들은 체하며 자기 속으로 독장수 셈치듯,
‘임지관이 칭찬을 저렇게 할 제는 대지가 분명한데 아마 산주가 있어, 투장(偸葬)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나 논둑·밭둑 같은 데 혈이 맺혀 범상한 눈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어서 성력이 조금 부족하면 쓰지 못하리라 하는 말인 듯하나, 내가 그만 성력은 있으니 성력 모자라 못 써볼라구? 유주산(有主山)이거든 돈을 주고 사보고, 정 아니 팔면 투장인들 못 할 것 있으며, 논밭두렁말고 물구덩이에다 장사를 지내라 해도 손톱만치도 서슴지 않고 써볼 터이야.’
하며 임지관의 시키는 대로 죽장망혜(竹杖芒鞋)에 가자는 대로 고양 땅을 다다르니, 여겨 보면 매부의 밥그릇이 높다고, 대지 명당이 이 근처에 있으려니 여겨 보니 산세도 별로 탈태하여 뵈고 수세(水勢)도 별로 명랑하여 임지관의 눈치만 살피는데, 임지관이 높직한 산상으로 올라가 펄쩍 주저앉으며,
“영감, 다리 아프지 아니하시오? 인제는 다 왔소. 이리 와 앉아 저것 좀 보시오.”
함진해가 그 곁으로 다가앉으며,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임지관이 오른 손가락을 꼿꼿이 펴들고 가리키며,
“저기 연기나는 데 보이지 아니합니까?”
“네, 저 축동나무가 시퍼렇게 들어선 데 말씀이오니까?”
“옳소, 그 동리 이름은 덕은리라 하는 대촌인데, 또 이편으로 보이는 산은 마둔리 뒷봉이오.”
“선생님께서 고양 지명을 어찌 그렇게 역력히 아십니까?”
“우리나라 심산 도중에 용세나 좋은 곳이면 내 발길 아니 들여놓은 데가 없었소. 그러나 정혈에를 내려가 보았으면 좋겠소마는, 산주에게 의심을 받을 뿐더러, 대단한 강척이라 당장 모다깃매를 당하고 쫓겨갈 터이니 멀찍이서 보기나 하시오.”
하며 이리저리 가리키며 입에 침이 없이 포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 면례 곧 하고 보면 당대 발복(發福)에 자손이 만당하여 금관자·옥관자가 삼태로 퍼부을 듯하더라.
“이 산 형곡은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니 당국은 옥녀체요, 안산은 거문고체라. 저기 보이는 봉은 장고사(長鼓砂)요, 여기 우뚝한 봉은 단소사(短簫砂)요, 전후좌우는 금장격(錦帳格)이며, 자좌오향(子坐午向)에 신득진파(申得辰破)이니 신자진삼 합격이요, 혈은 횡접와(橫接窩)체에 포전이 매우 좋으니 자손이 대단히 번성할 터이오. 자, 더 보실 것 없이 이 자리에 선장 산소를 모셔 볼 경륜을 해보시오.”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얻어 쓰겠습니까? 선생님 지휘대로 하겠습니다.”
“영감이 하실 탓이지, 나는 별수가 있소? 그러나 내가 연전에 이 산판을 보고 하도 욕심이 나서 산 임자가 누구인지는 탐문하여 보았소.”
“산주가 어디 사는 누구인가요?”
“마둔리 윗동리 사는 최생원 집이라는데, 대소가 수십 집이 모두 연장접옥(連墻接屋)하여 자작일촌(自作一村)으로 산다 하옵디다. 그런데 그 여러집 사람들이 모두 불초하여, 남이 홀만히 볼 수 없으나 형세는 한 집도 조석 분명히 먹는 자가 없다 합디다.”
“가세가 그렇게 간구(艱苟)하면 산지를 팔라면 말을 들을까요?”
“그 역시 나더러 물을 것 아니라, 오늘은 도로 가셨다가 내일 모레간 몸소 내려와 산주를 찾아보시고 간곡히 말씀을 해보시오. 그 자리 하나만 사면 그 국내에 또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 한 자리가 있으니, 그것도 마저 사서 왕장(王丈) 산소를 면례해 보십시다.”
그 산 안에 명당이 한 곳뿐 아니요, 또 한 곳이 있단 말을 듣고 함진해가 불 같은 욕심이 어떻게 치미는지, 산주가 팔기 곧 하면 자기 든 집재 세산재 먼 곳에 있는 외장까지 모두 주고 벌건 몸뚱이가 한데로 나앉더라도 기어이 사서 써볼 생각이라.
평생에 오 리 밖을 걸어다녀 보지 못한 터에 평지도 아니고 등산까지 하여 가며 사오십 리를 왕환(往還)하였으니 다리도 아플 것이요, 피곤도 할 것인데, 그 이튿날 밝기를 기다려 시골서 귀물로 알 만한 물종을 각가지로 장만해서 두어 바리 실리고 고양 길을 발행하는데, 임지관이 무엇이라고 두어 마디 이르니까 함진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옳소, 선생님 말씀이 옳소. 그렇게 해보지요. 위선하여 하는 일에 무엇이 어려울 것 있소?”
하더니 하인을 시키어 공석 한 잎을 둘둘 말아 장독교 뒤채 위에 매달아 가지고 떠나가더라.
세상 사람 사는 것이 천태만상이라. 열 집이면 열 집이 다 다르고, 백 집이면 백 집이 다 달라서 잘살기로 말하여도 여러 백천 층이요, 못살기로 말해도 여러 백천 층이라. 잘사는 부자로 첫째 되기도 극난하지마는, 못사는 빈호로 첫째 되기도 역시 드문 터인데, 고양 사는 옥여 최생원은 고양 안에는 고사 물론하고 대한 십삼도 안에 둘째 가라면 원통하다 할 만한 간난이라. 그 중에 누대 상전(相傳)하여 오는 선영은 있어, 해마다 솔포기가 푸르스름하면 모조리 싹싹 깎아 팔아먹더니, 산이라 하는 것은 큰 나무가 들어서서 뿌리가 얽히지 아니하면 사태가 나며 토피가 으레 벗는 법이라.
다음부터는 풋나뭇짐씩 뜯어 생활하던 길도 없어지고 다만 돈 백이라도 주고 뫼 한 장 쓰겠다면 유공불급하여 쇤네 쇤네 하여 가며 팔아먹는 터이나, 그런 일이 어찌 날마다 있고 달마다 있으리요. 두수없이 꼭 굶어 죽게 되어 이웃집 도끼를 빌려 가지고 깎아 먹던 솔그루 썩은 고자등걸을 캐어지고 서울로 갔다 팔기로 생애를 하느라고 금방울의 집에다 단골을 정하고 하루 걸러큼 다녀 매우 숙친한 까닭으로 저의 집 지내는 사정을 낱낱이 말하고 나뭇값 외에 쌀되·돈관을 얻어다 먹고 지내매, 금방울의 분부라면 거역지 못하는 법이, 칙령이라면 너무 과도하고 황송한 말이지마는, 본고을 원의 지령만은 착실하더라.
하루는 나뭇짐을 지고 들어오니까, 요지선녀(瑤池仙女)같이 쳐다보고 지내던 금방울이가 반색을 하여 반기며 안으로 잡담지하고 들어오라 하더니,
“에그, 당신은 양반이시고 나는 여염사람이지마는, 여러 해 친하여 숭허물 없는 터에 관계 있습니까? 우리 인제는 의남매를 정하십시다. 오빠, 전에는 체통을 보시느라고 설면히 굴으셨지마는, 어서 신발을 끄르고 방으로 들어오시오. 추우시기는 좀 하시겠소? 구시월 막새바람에 홑것을 그저 입고. 여보게 부엌어멈, 밥숭늉 좀 덥게 데우고, 새로 해넣은 솜바지 좀 놓아 가져오게. 오빠, 편히 앉으셔서 어한 좀 하시오.”
이 모양으로 예 없던 정이 물 퍼붓듯 쏟아지니, 최생원이 웬 영문인지 알지를 못하고 쭈뼛쭈뼛하다가 간신히 입을 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