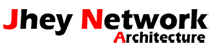함진해 내외가 번차례로 앓아, 하루 빤한 날이 별로 없어 푸닥거리 성주받이를 아무리 펄쩍 하여도 아무 효험이 없으니 최씨도 넋이 풀리고 금방울도 무안하여, 다시 무슨 일을 시킬 염치가 없으니, 그렇다고 그만두고 보면 함씨의 재물을 다시 구경도 못 해볼 터이라, 한 가지 새 의견을 내어 나머지까지 마저 훑어 내는 바람에 함씨의 조상 뼈다귀가 낱낱이 놀아나더라.
사람마다 한 가지 흉은 없기가 어려우되, 전라도 낙안 사는 임지관이라하는 사람은 제반 악증을 모두 겸하여,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그자에게 들어 속아넘어가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제 것이 한푼 없어도 호의호식(好衣好食)하고 경향으로 출몰하며 남 속이는 재주를 한두 가지만 품은 것이 아니라.
의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의원(醫員) 행세도 하고, 음양술수(陰陽術數)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인(異人) 자처도 하고, 산리에 고혹(蠱惑)한 사람을 만나면 지관(地官) 노릇도 하여,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를 쫓아다니며 후려 넘기는데 외양도 번번하고 글자도 무식지 않고, 구변도 썩좋은지라, 대저 마름쇠로 상하 삼판에 어디를 가든지 곁자리가 비지 아니하는 유명한 자이라.
서울 와 주인을 정하되, 장안 만호 하고많은 집에 장과 국이 맞느라고 금방울의 이웃집에다 정하고 있으니, 유유상종(類類相從)으로 자연 친숙하여 남매지의(男妹之義)를 맺어, 누이님, 오빠 하며 정의가 매우 두터운 터이라. 못 할 말, 할 말 분간할 것 없이 속에 있는 회포를 의논할 만치 되었는데, 하루는 임지관을 청하여 한나절을 무어라 쑥덕공론을 하더니 임지관이 그날로 행장을 차려 주인을 떠나가더라.
함진해가 여러 날 최씨의 병구완을 하다가 자기도 성치 못한 몸에 자연 피곤하여 사랑에 나와 정신없이 누웠더니, 노파가 창 밖에 와서 근심이 뚝뚝 듣는 말소리로,
“영감마님, 주무십니까?”
함진해가 깜짝 놀라며,
“왜 그러나, 마님 병이 더하신가?”
“아니올시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아니 할 생각이 없어서 국수당 만신을 청해 조상대를 내려 보니까 이상스러운 말이 나서 영감께 여쭙니다.”
“무슨 이상한 말이 있더란 말인가? 무당의 소리도 인제는 듣기 싫어.”
“댁에 위로할 귀신은 위로도 하고, 퇴송할 귀신은 퇴송도 하였으니 우환걱정이 다시는 없을 터인데, 한 가지 조상의 산소가 잘못 들으셔서 화패가 자주 있다고, 고명한 지관을 찾아 하루바삐 면례(緬禮)를 하면 곧 효험을 보겠다 하여요.”
“이 사람, 쓸데없는 말 고만두게. 고명한 지관이 어디 있다던가? 내가 몇십 년 구산에 금정(金井) 하나 바로 놓는 자를 만나 보지도 못했네.”
“만신에게 한 번 더 속아 보실 작정 하시고 들어오셔서 물어 보십시오. 정성이 간곡하면 천하명풍을 만나리라고 공수를 줍디다.”
“정성 정성, 내가 무당의 말 듣기 전에 명풍을 만나려고 정성도 적지않이 들여 보았네마는, 다 쓸데없데. 그러나 허허실수로 한번 물어나 보세.”
하고 귀밑에 옥관자를 붙이고 제왈 점잖다 하는 위인이 남부끄러운 줄도 그다지 모르던지 노파의 궁둥이를 줄줄 따라 들어와 금방울 앞에 가 납신 앉으며,
“그래, 우리집 우환이 산화로 그러해? 그 말이 어지간하기는 한걸. 세상에 똑똑한 지관을 만날 수 없어 선대감 내외분 산소부터 내 마음에 일상 미흡하건마는 그대로 뫼셔 두었는걸. 어떻게 하면 도선이·무학이 같은 명풍을 만날꼬? 시키는 대로 정성은 내가 드리지.”
금방울이 백지로 한허리를 질끈 맨 청솔가지를 바른손으로 잡고 쌀모판에다 한참 딱딱 그루박으며 엮어 대는 듯이 무어라고 주워섬기더니 상큼하게 쪼그리고 앉으며 두 손 끝을 싹싹 비비고,
“에그, 이상도 해라. 영감께서 이런 말을 들으시면 제가 지어내는 줄 아시겠네.”
“무엇이 그리 이상해? 대관절 어떻게 하면 만나겠나, 그것이나 물어 보라니까.”
“글쎄 그 말씀이올시다. 알 수는 없지마는 신의 말씀이 하도 정녕하게 집어 낸 듯이 일러주시니 시험하여 보십시오. 내일 정오 십이시에 무학재 고개를 넘어가면 산겨드락 소나무 밑에서 어떠한 사람이 돌을 베고 잘 것이니, 그 사람에게 정성을 잘 들여 보시라고 공수를 주셨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지내 보지 않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든지요, 밤만 지내면 즉 내일이니, 잠시 떠나시기 어려우셔도 영감께서 손수 가보시든지 정 겨를이 없으면 친신한 사람을 보내어 보십시오.”
“그 시에 가면 정녕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명산을 얻어 쓰려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될 수가 있나? 내가 친히 가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이지.”
하더니 탈것 두 채를 마침 준비하였다가, 그 시간을 맞추어 무학재로 향하는데, 새문 밖에를 나서 이전 경기 감영 모퉁이를 돌아서더니 함진해가 눈을 연해 씻으며 독립문을 향하고 맞은편 산 근처 푸르스름한 나무 밑이라고는 하나 내어 놓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보며 가도 사람이라고는 나무꾼 하나 볼 수 없는지라, 속중으로,
‘허허, 또 속았구. 번연히 무당이란 것이 헛것인 줄 짐작하면서 집안에서 하도 떠들기에 고집을 못 할 뿐 아니라, 어떤 말은 여합부절로 맞기도 하니까 전수히 아니 믿을 수 없어 오늘도 여기를 나오는 길인데.’
하며 무학재를 막 넘어서니까 남산 한 허리에서 연기가 물씬 나며 오포 놓는 소리가 귀가 딱 맞치게 탕 한번 나는데, 길 위 산비탈 아래 소나무 한주가 우뚝 섰고 그 밑에 어떤 사람 하나가 갓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덮고 모로 누워 잠이 곤히 들었는지라. 함진해가 반색을 하여 인력거에서 내려 곁에 가 가만히 앉아 행여나 잠을 놀라 깨울세라, 기침도 크게 못 하고 있는데, 한 식경은 되어 잠을 깨는 모양같이 기지개 한 번을 켜더니, 다시 돌아누워 잠이 또 드는지라, 아무 말도 못 하고 석양이 다 되도록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자가 부시시 일어나 두 손으로 눈을 썩썩 비비고 입맛을 쩍쩍 다시며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함진해가 공손히 앞에 가 꿇어앉으며 구상전이나 만난 듯이 자기 몸을 훨쩍 쳐뜨려 수작을 붙인다.
“이왕 일차도 뵈온 적이 없습니다. 기운이 안녕하십니까?”
그자는 못 들은 체하고 눈을 내리깔고…… 그리할수록 함진해는 말소리를 나직이 하여 가며,
“문안 다동 사는 함일덕이올시다.”
그자는 여전히 못 들은 체하고…… 이같이 한 시 동안은 있더니 그자가 눈살을 잔뜩 찡그리고,
“응, 괴상한고! 응, 누가 긴치 않게 일러주었노?”
그 말을 들으니 함진해 생각에 제갈량(諸葛亮)이나 만난 듯이,
‘옳다, 인제야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 천행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마는 조금이라도 내 성의가 부족하면 아니 될 터이니까…….’
하고서 다시 일어나 절을 코가 깨어지게 하며,
“제가 여러 십 년을 두고 한번 뵈옵기를 주야 응축하였습니다마는, 종시 정성이 부족하여 오늘이야 뵈옵니다. 타실 것을 미리 등대하였으니 누추하시나마 제 집으로 행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자가 함진해를 물끄러미 보다가 허허 웃으며,
“할 일 없소. 벌써 이 지경이 된 터에 박절히 대접할 수 있소? 그러나 댁 소원이 집안 질고나 없고 슬하에 귀자(貴子)나 낳을 명당 한 곳을 얻으려 하지 않소?”
함진해의 혀가 절로 내둘리며 유공불급(猶恐不及)하게,
“네, 다른 소원은 아무것도 없고, 그 두 가지 뿐이올시다. 선친의 묘소를 흉지에다 뫼셔 화패가 비상합니다. 자식 되어 제 화패는 고사하고 부모 백골이 불안하시니 일시가 민망하오이다.”
“내 역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별도리가 있소? 그나저나 오늘은 피곤하여 잠도 더 자야 하겠고, 볼일도 있어 못 가겠으니 내일 이맘때 동대문 밖 관왕묘 앞으로 나오되 아무도 데리지 말고 댁 혼자 오시오. 나는 누워 자겠고. 어서 들어가시오.”
하며 돌을 다시 베고 드러눕더니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는지라. 함진해가 다시 말 한마디 붙여 보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와, 이튿날 오정이 될락말락하여 단장 하나만 짚고 홀로 동관왕묘를 나아가느라니 자연 십여 분 동안이늦었는지라, 그자가 벌써 와 앉았다가 함진해를 보고 정색하여 말하되,
“점잖은 사람과 상약(相約)을 하였으면 시간을 어기지 않는 일이 당연하거늘 어찌하여 인제 오느뇨?”
“시간을 대어 오느라는 것이 조금 늦어서 오래 기다리셨을 듯하오니 죄송만만하도소이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정에 삼각산 백운대 밑으로 오라.”
하고 뒤도 아니 돌아보고 왕십리를 향하고 가거늘, 함씨가 더욱 조민(燥悶)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길로 금방울을 청하여 소경사를 이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문의를 한즉, 금방울이 손으로 왼편 턱을 괴고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다가,
“에그, 영감마님,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명풍의 손을 비시려면서 예단(禮單) 한 가지 없이 그대로 가보시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하여 터의를 얼른 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보오이다. 내일은 다만 백지 한 장이라도 정성껏 폐백을 하시고 청해 보십시오.”
“옳지, 그 말이 근리하군. 내가 까마니 잊고서 빈손으로 연일 단겼으니 그 양반이 오죽 미거히 여겼을라구. 폐백을 아니하면 모르거니와, 백지 한권이 다 무엇이야? 그도 형세가 헐수할수없으면 용혹무괴(容或無怪)어니와 내 처지에야 그럴 수가 있나? 하불실 일이백 원 가량은 폐백을 하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