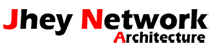또 일청을 부르더니,
“자네의 종가 위하는 직심은 이미 듣고 보아 아는 일이어니와, 여러 해 절적한 일은 잘못함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 자네 사촌만 야속타 말고 지금 회의 가결된 일과 같이 내일 내로 즉시 종표를 데려다 종가에 바치고, 자네도 반이(搬移)하여 올라와, 한집에 있어 대소사의 치산을 전담 극력하여 누대 향화를 잘 받들도록 하소.”
함진해가 전일 같으면 반대를 해도 여간이 아닐 것이요, 고집을 세워도 어지간치 아니할 터이로되, 본래 천성은 과히 악한 사람이 아니요, 무식한 부인과 간특한 하속에게 고혹한 바 되어 인사 정신을 못 차렸더니 문중 공론을 듣고 자기 신세를 생각한즉, 지난 일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말못되어 가는 가세에, 우환질고는 그칠 날이 없는데, 수하에 자질간 대신 수고하여 줄 사람이라고는 그림자 하나 없은즉, 양자는 불역지전(不易之典)하여야 할 것이요, 양자를 하자면 집안 아이 내어 놓고 원촌(遠寸)에 데려올 수도 없으며, 데려온대도 내 집이 전 세월 같지 않아, 한없는 진구덥을 치르고 배겨 있을 자식이 없을 것이니, 종중 회의에 못 이기는 체하고 종표를 양자하 여 제 아비 시켜 뒷배를 보아 주게 하면, 줄어든 각사가 더 줄어질 여지는 없을 것이요, 제 부자가 아무 짓을 하기로 우리 내외 죽기 전 병구완과 먹도록 입도록이야 아니 하여 줄 수 없으니, 핑계 김에 잘되었다 하고 외양으로 천연스럽게 대답을 한다.
“종중 처결이 그러하시니, 무엇이라도 거역할 가망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사를 다 쓸어 맡기겠습니다.”
“그렇지, 고마운 말일세. 주역(周易)에 불원복(不遠復)이라 하였으니, 자네를 두고 한 말일세.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겠나마는, 자네같이 오래지 아니하여 회복하는 자가 어데 또 있겠나? 허허, 인제는 우리 종가집을 위하여 하례할 만한 일일세.”
하며 일청더러,
“자네 종씨 말은 저러하니 자네 말도 좀 들어 보세.”
“종의도 이 같으시고, 종형의 뜻도 저러시니, 어찌 군말씀을 하오리까마는, 저 같은 위인이 열이기로 어찌 종형 하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형이 시키는 말 곧 있으면 정성껏 거행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장황히 더 의논할 것 없이 이 길로 자네가 떠나 내려가 종표를 데리고 올라오소. 아무리 급해도 그 아이 의복이라도 빨아 입혀야 할 터인즉, 자연 수일 지체는 될 것이니 오늘 내일 모레, 오늘까지 닷새 동안이면 하루 가고, 하루 오고 넉넉히 되겠네. 그날은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모여야 하겠네.”
하며 일변 일청을 재촉하여 발행케 하고, 일변 진해를 다시 당부한 후 이 다음 다시 모이기로 문장 이하가 각각 헤어져 가더라.
여러 함씨들이 종표의 올라올 승시하여 일제히 모여 예를 행케 하고 내당에 들여보내어, 최씨 부인에게 모자지례로 뵈옵는데, 이때 최씨는 병은 아무리 깊었더라도 그 병이 부집 죄듯 왜깍지깍 세상 모르고 앓는 증세가 아니라, 시난고난 앓는 중 중풍이 되어 반신불수로 똥오줌을 받내되, 정신은참기름송이 같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까지는 하는 터이라, 일청이가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양을 본즉, 눈꼬리가 창아곱패 되듯 하며, 앞니가 보도독보도독 갈리건마는, 일문 대종중이 모여 하는 일이요, 또 자기가 그 처신이 되었으니, 무엇이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어, 다만 어금니 빠진 표범과 발톱 부러진 매와 같이, 할퀴며 물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노리며 으르렁대어, 종표가 어머니 어머니 하며, 앞에 와 어리대는 것을 대답 한마디 없이 거들떠도 아니 보니 속담에, ‘병든 나무에 좀나기가 쉽다’고 자기의 소생도 아니요, 양자로 데려온 아이를 그 모양으로 냉대하니, 의리모르는 노파 등속이 종회 이후에는 어엿이 나덤벙이지는 못해도 여전히 최부인에게는 왕래통신이 은근하여, 종표의 험담을 빗발치듯 담아 부으니 최씨는 더구나 미워하여 날로 구박이 자심하건마는, 종표는 일정한 정성을 변치 아니하고 똥오줌을 손수 받내며 조금도 어려운 기색이 없어, 밤낮 옷끈을 끄르지 아니하고 단잠을 잘 줄 모르며, 진해에게 혼정신성(昏定晨省)과 최씨에게 시탕(侍湯) 범절이 목석이라도 감동할 만하더라.
본래 사람의 염량 후박(厚薄)은 병중에 알기 쉬운 고로 말 한마디에 야속한 마음도 잘 나고, 고마운 생각도 잘 나는 법이라. 최씨가 종표 부자를 구수같이 미워하던 그 마음이 차차 감해지고, 감사하고 기특한 생각이 차차 더해지니, 이는 자기 일신이 괴롭고 아픈 중 맑은 정신이 들 적마다 오장에서 절로 솟아나오는 생각이라.
‘에구 다리야, 에구 팔이야, 일신을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니 똥오줌을 마음대로 눌 수가 있나! 세상에 모를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내게 단것 쓴 것 다 얻어먹던 것들은 웃느라고 문병 한 번 없지. 그것들은 오히려 예사지만, 안잠 할미로 말하면 제 죽기 전에는 나를 배반치 못할 터이어늘, 똥 한 번 오줌 한 번을 치우려면 군말이 한두 마디가 아니요, 그나마 목이 터지도록 열스무 번 불러야 겨우 눈살을 잡고 마지못하여 오니, 살지무석(殺之無惜)하고 의리부동한 것도 있다. 에구구 팔다리야, 종표는 기특도 하지. 제가 내게 무슨 정이 들었다고 어린것이 더럽고 괴로운 줄도 모르고 단잠을 아니 자고 잠시를 떠나지 아니하니 그 아니 신통한가! 에그, 집안이 어쩌면 그렇게 되었던지 돈냥 될 것은 모두 전당을 잡혀 먹고, 약 한 첩 지어 먹자해도 일푼 도리 없더니, 시사촌께서 와 계신 후로는 그 걱정 저 걱정 도무지 모르고 지내지. 내가 내 일을 생각해도 벌역을 받아 병신 되어 싸지 않은가! 남의 말만 곧이듣고 내 집안 양반을 괄시하였으니.’
하여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 세상 짓이 다 헛일을 한 듯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 가더라.
최씨 부인의 병이 감세가 있을 때가 되었든지, 약을 바로 쓰고 조섭을 잘해 그렇든지, 기거 동작을 도무지 못 하던 몸이라서 능히 일어나서 능히 앉으며, 지팡이를 짚고 방문 밖에도 나서 보니, 자기 생각에도 희한하고 다행하여, 이것이 다 시사촌의 구원과 종표의 정성으로 효험을 보았거니 싶어 없던 인정이 물 퍼붓듯 하는데,
“종표야, 날이 선선하다. 핫옷을 갈아입어라. 내 병으로 해서 잠도 못 자며 고생을 하더니, 네 얼굴이 처음 올 때보다 반쪽이 되었구나. 시장하겠다. 점심 먹어라. 병구완도 하려니와 성한 사람도 기운을 차려야지. 삼랑아, 도련님 진지 차려 드려라.”
“저는 배고프지 아니합니다. 약 잡수신 지 한참 되어 다 내리셨겠으니 진지 끓인 것을 좀 잡수셔야지, 속이 너무 비셔서 못 씁니다.”
“너 먹는 것을 보아야 내가 먹지, 너 아니 먹으면 나도 아니 먹겠다.”
하며 자애가 오장에서 우러나오니, 세상에 남의 집에 출가하여 그 집을 장도감 만드는 부인이 하고많은데, 열에 아홉은 소견이 편협지 아니하면 심술이 대단하여, 한번 고집을 내어 놓으면 관머리에서 은정 소리가 땅땅 나기 전에는 다시 변통을 못 하건마는, 최부인은 고집을 내면 암소 곧달음으로 고삐 잡아당길 새 없이,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고야 말면서도, 전후 사리는 멀쩡하여 잘잘못을 짐작 못 하던 터가 아니라, 한번 마음이 바로잡히기 시작하더니, 본래 무던하던 부인보다 오히려 못지 아니하여 처사에 유지함이 상등(上等)사회에 참례할 만하다.
하루는 자기 남편과 시사촌과 사촌동서와 종표까지 한자리에 모여앉은 좌상에서 최씨 부인의 발론으로, 종표를 중학교에 입학게 하여, 사오 년 만에 졸업한 후에 다시 법률전문학교에 보내어 공부를 시키는데, 생양정 부모의 정성도 도저하지마는, 종표의 열심이 어찌 대단하던지 시험마다 만점을 얻어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니, 함종표의 명예가 사회상에 현자하여 만장공천(滿場公薦)으로 평리원 판사를 하였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정치를 쇄신하여, 음양 술객과 무복(巫卜) 잡류배를 일병 포박(捕縛)하여 차례로 신문하는 중에 하루는 부녀 일명을 잡아들여 오거늘 종표의 내심으로,
‘저 계집도 사람은 일반인데, 무슨 노릇을 못 해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무녀 노릇을 하다가 이 지경을 당하노? 우리집에서도 아마 이따위 년에게 속고 패가를 했을 것이니 아무 때든지 그년만 붙들고 보면 대매에 쳐죽여 첫째로 우리집 설분(雪憤)도 하고, 둘째로 세상 사람에 후일 경계를하리라.’
하는데 잡혀 들어오던 무녀가 신문장에를 당도하더니, 그 똘똘하고 살기가 다락다락하던 위인이 별안간에 얼굴빛이 사상(死相)이 되어 목소리를 벌벌떨며 자초행위를 개개 승복(承服)하되,
“의신을 장하에 죽이신대도 어디 가 한가하오리까마는 죽을 때 죽사와도 한마디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의신의 무녀 노릇 하압기는 다름이 아니라, 생애가 어려워 마지못해 하는 일인데, 한때 얻어먹고 살라고 우중으로 말마디가 신통히 맞사와 살면서 이 소문을 듣고 부르오니, 속담에 굿들은 무당이라고, 부르는 곳마다 가서 정성껏 큰 굿도 하여 주고, 푸념도 하여준 죄밖에 다른 죄는 없습니다.”
종표의 말소리가 본래 기걸하여 예사로 하는 말도 천장이 드르렁드르렁 울리는 터이라, 그 무녀의 말이 막 그치자 가래침 한번을 칵 배앝고,
“네 말 듣거라. 세상에 무슨 생애를 못 해먹어 요사한 말을 주작하여 사람을 속여 전곡(錢穀)을 도적하고 패가망신까지 시키노?”
“의신이 무녀 된 이후로 남북촌에 단골댁이 허구 많으셔도 불행히 다동 함진해 댁에서 그 댁 운수로 패가를 하셨지, 그 외에는 한 댁도 형세가 늘면 늘었지 줄으신 댁은 없사온대, 이처럼 분부를 하시니 하정에 억울하오이다.”
함판사가 함진해 댁이라는 말을 들으니,
‘옳다, 이년이 우리집 결딴내던 년이로구나. 불문곡직하고 당장 그대로 엎어 놓고 난장으로 죽이고 싶지마는, 법률 배운 사람이 미개한 시대에 행하던 남형(濫刑)을 행할 수 없고 중률이나 쓰자면 그년의 전후 죄상을 명백히 공초케 하여야 옳것다.’
하고 한 손 눙치며,
“네 말 같으면 남북촌 여러 단골집이 모두 네 공효로 형세를 부지한 모양 같고나. 그러면 네 단골 되기는 일반인데, 함진해 댁에서는 어찌하여 독이 패가를 하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