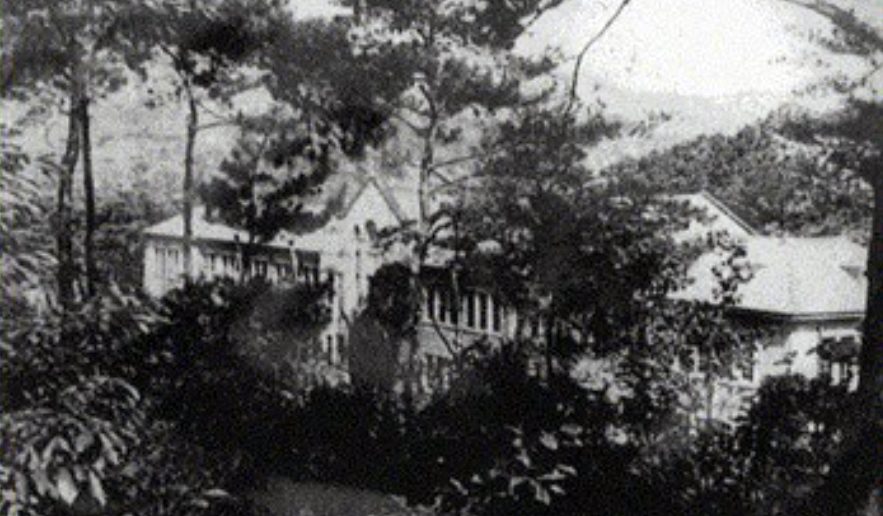영암 군경 충돌사건은 1947년 6월 3일 전남 영암에서 국방경비대 제4연대 제1대대와 영암 경찰간에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이었다. 광주 주둔 제4연대는 창설 초기부터 대원들의 자질 문제 때문에 전국의 경비대 중에서 말썽이 많은 연대 중의 하나로 꼽혔다.
사건은 1947년 5월 초 한 경비대원의 친형이 좌익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광양경찰서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이 부대내에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던 제4연대 대원들은 5월 11일(토요일) 외출을 나간 대원들이 광양경찰서로 몰려가 사찰계 형사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후 철수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도 보복 차원에서 그 다음주에 외출 나온 경비대원들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외출 나갔던 경비대원들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복귀하자, 흥분한 제1대대 병사들이 2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광양경찰서로 몰려가 경찰서를 쑥 밭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즉시 경찰에 의해 미군정에 보고되었으며, 경비대총사령부에서는 미군정 당국의 유감 표시에 따라 조암(趙岩) 소령을 즉각 해임하고 이한림(李翰林) 소령을 연대장으로 발령(1947. 5. 21)하여 사건 수습을 지시하였다. 이한림 소령은 광주로 부임한 즉시 광양 경찰과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을 보고 경비대와 경찰간의 친선을 적극 도모한다는 데 약속하였다. 이로써 광양에서의 마찰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제4연대와 경찰간의 반목은 오히려 커져만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6월 1일 영암경찰서 신북지서에서 제4연대 소속의 김형남(金亨南) 하사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김희준(金熙濬) 중위와 군기대장 정지웅(鄭址雄) 중위는 군기병 4명을 데리고 신북지서로 갔다. 이들이 신북지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김형남 하사를 영암경찰서로 압송한 뒤였다. 사건은 김형남 하사가 외박 후 부대복귀를 위해 신북지서 안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경찰관과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시비의 원인은 경찰이 무궁화 모양인 경비대의 모표(帽標)를 사꾸라 같다고 비아냥거린 데에서 비롯되었다. 김하사가 먼저 경찰들을 공격하자 지서순경들이 본서에 경비대원의 경찰 폭행 사실을 보고하고 본서에서 형사들이 출동해 김하사를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죄목으로 연행했다.
한편 지서밖에서 군기병들은 외출 사병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다가 흥분한 나머지 보초를 서고 있던 순경을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구타를 하였다. 당시 김중위와 정중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암본서로 가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경비대원들이 보초 순경을 구타하고 본서로 향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경계 근무를 강화한 상태였다.
일행은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경찰 간부들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경비대측의 원만한 해결 요구에 경찰측은 경비대가 경찰의 보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김중위와 정중위는 귀대 길에 올랐다. 이때 경찰 10여명을 태운 차량이 먼저 출발하고 300m 뒤에서 김중위 일행의 차가 달렸다. 차가 신북지서 앞을 통과할 즈음에 갑자기 앞서가던 경찰이 공포를 쏘면서 김중위 일행의 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고 사병들을 하차시켰다. 수적으로나 무장면에서 경비대를 압도한 경찰은 군기대원들을 지서안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하고 김중위와 정중위를 지서장 앞에 무릎을 꿇도록 강요했다. 경찰로부터 뭇매를 맞은 군기대 선임하사관은 광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의 폭행 이유는 보초를 서고 있던 경찰을 군기대원들이 먼저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이때만해도 김중위와 정중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때 도경찰청 미고문관이 통역관을 데리고 신북지서에 나타나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이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될 수도 있었지만 병원으로 후송된 선임하사관이 운전병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부대원들에게 전했다. 흥분한 300여명의 대원들은 김은배(金恩培) 중사의 지휘하에 무기고를 열어 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차량 7대를 이용해 출동했다. 제1대대장 최창언(崔昌彦) 대위가 급보를 받고 부대에 들어와 장교들을 불러 심하게 꾸짖고 사태 수습을 위해 장교들도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연대장 이한림 소령도 밤중에 미고문관의 방문을 받고 함께 연대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원들이 떠난 뒤였다.
부대원들의 뒤를 따라간 장교들이 영암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비대가 경찰로부터 사격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경비대원들은 경찰서 돌격을 감행했으나 미리 철저한 준비를 갖춘 경찰의 저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경찰은 망루에다 경기관총을 걸어 놓고 사격을 가하는 반면에 경비대원들은 99식 소총과 각자 몇 발의 탄약만을 소지하고 있어서 교전은 경비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새벽에 현장에 도착한 이한림 연대장은 영암교회에서 부상병 상황과 사태 파악에 나선 후 경찰과의 담판을 시도했다. 연대장은 우선 대원들의 사격을 중지시키고 경찰서 앞 200m 지점까지 접근해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연대장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하고 심지어 수류탄까지 투척해 연대장 호위병들이 사상을 당함으로써 양자간의 사격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건은 6월 2일 10시경 이한림 연대장이 영암군수와 함께 서장을 만나 ‘유혈방지’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 사건으로 경비대측은 6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한 반면에 경찰측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또 군기대원 3명이 경찰관 폭행죄로 군정재판에 회부됨으로써 경비대는 사기가 저하된 반면에 경찰은 경비대를 더욱 우습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비대사령부에서는 이한림 연대장에게 원만한 사건 수습의 공로로 특별 표창장을 수여했다. 반면 사건 관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주번사령이었던 이관식(李寬植) 중위가 파면되고 대대 선임하사관 김인배 상사가 병력 지휘책임, 최석기(崔錫基) 상사가 수송부 선임하사관으로서 차량을 동원한 책임으로 각각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에서의 군 · 경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군․경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좌익세력은 제4연대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이 사건은 제4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여수의 제14연대에도 영향을 미쳐 1948년 10월 ‘여순 10·19사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