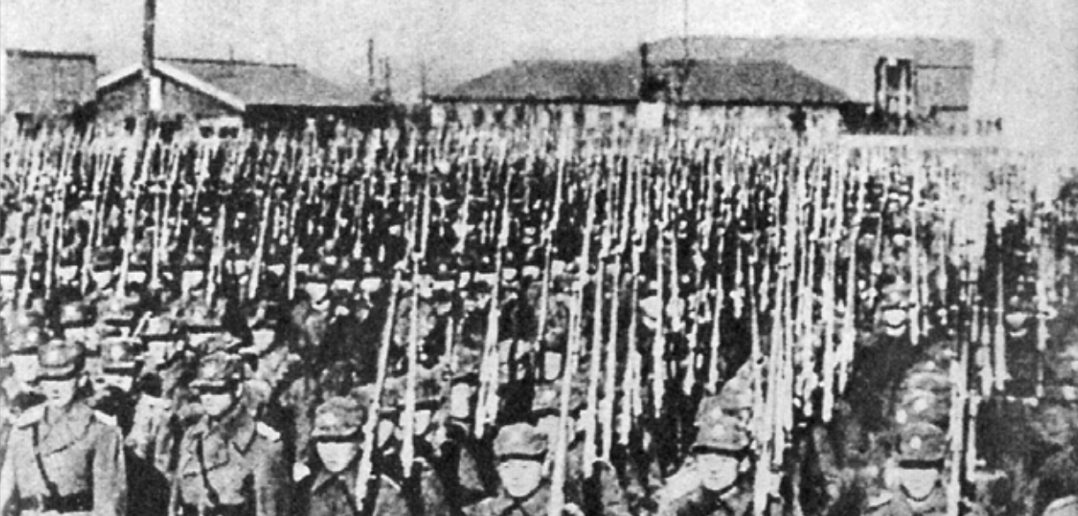광복 직후 좌익세력은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와 조선학병동맹(朝鮮學兵同盟) 등을 통해 자체의 무력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청내에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가 설치되고 1946년 1월 15일 국방사령부 예하에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가 창설됨에 따라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은 해체되었다. 이는 미 군정청이 1946년 1월 21일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모든 ‘자생적 군사단체’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자생적 군사단체’의 해산은 곧 좌익세력의 독자적인 무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 이하 ‘남로당’)은 국방경비대가 점차 군대의 면모를 갖추어 가자 군에 대한 침투 공작을 시도하였다. 남로당의 국방경비대에 대한 침투 공작은 1947년 7월 당 중앙에 군사부(軍事部)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어 1948년 5․10선거 과정에서 좌익세력의 피검자가 많아지자 본격화하였다. 지역적으로 좌익 활동이 왕성했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 공작은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여 방법을 달리하였다. 장교의 경우는 주로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내에 이미 침투해 있거나 포섭된 조직망을 통하여 남로당 추천자를 입교시키는 방법과 임관된 장교를 통하여 지인(知人)들을 포섭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인 실력으로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는 방법, 둘째 정부․군․정계의 유력 인사를 이용하여 추천을 받아 경비사관학교에 입교시키는 방법, 셋째 남로당 수뇌부가 군내 당조직에 추천하여 사관학교에 입교·침투 시키는 방법, 넷째 사관학교 직원으로 있는 당 세포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들을 매수하여 입교시키는 방법, 다섯째 기성 장교의 신원과 인적 사항을 조사하여 접근할 소지나 잠재 성분을 내재하고 있는 자를 포섭하는 방법, 여섯째 기성 장교들의 대인 관계, 지연, 혈연, 인연, 동기동창 관계 등 다양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포섭공작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었다.
한편 국방경비대의 사병들은 대부분 빈농출신으로 광복 후 좌익단체에 가담했던 자들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쫓겨 경비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비대 사병층에는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남로당에서는 경비대와 경찰간의 반목대립을 적극 활용하였다. 당시 경비대에는 미 군정청의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원칙에 따라 모병시 신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좌익청년들이 대거 군문(軍門)에 들어올 수 있었다. 사병의 경우 첫째 부락에서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은 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입대시켰다. 둘째 좌익계 활동에서 노출된 자들을 리·면·군·도당을 거쳐 각부대의 조직책에게 추천하여 입대시켰다. 셋째 경찰과 적대관계나 혹은 반감이 있는 자들을 입대시켰다. 넷째 기성 사병의 경우 부대 내의 남로당원인 장교나 하사관을 통해 포섭하도록 했다. 다섯째 조직에 정식으로 가입시키
지 않더라도 접근의 소지가 있는 사병들에 대해서는 군내의 조직원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 동조하게 만드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남로당의 군내 침투 공작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할만한 것은 당 중앙 군사부가 장교를 관리하고, 각 지방 당부가 사병을 관리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장교의 경우 선발과 교육, 배치 등 모든 인사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또 보직관계로 근무지 이동이 심했기 때문에 당 중앙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포섭된 장교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병의 경우에는 각 도당위원회에서 직접 공작했다. 각 도(道)에 있는 연대는 도가 모병단위였고 부대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로당은 미군과 맞설만한 군사력을 가질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미군이 철수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국방경비대가 권력 쟁취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교두보로서 경비대내에 좌익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로당의 군내 침투 공작은 장교조직과 사병조직간, 그리고 도당 지도부와 장교 조직간의 분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