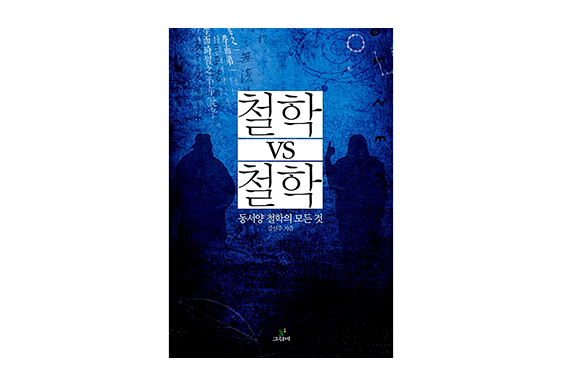예(禮)
인(仁)과 함께 공자의 사유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귀족계급 내부에서 통용되던 사회적 예절은 의미했다. 공자가 숭배했던 주(周)나라의 경우 예(禮)가 귀족계급 내부의 규범으로 가능했다면, 법(法)은 피지배계급에 통용되었던 것이었다. 예를 어겼을 때 귀족들은 정신적 치욕을 느끼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졌다. 반면 법을 어긴 피지배계급은 참혹한 육체적 형벌에 처해졌다. 공자는 춘추시대 혼란했던 원인을 귀족계급들이 예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서 찾았다. 그가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자신을 이겨서 예를 회복하가”라고 주장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강신주, 『철학 vs 철학』(서울: 그린비, 2010),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