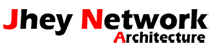이말에 놈이 경풍을 하도록 반색하여 애꾸눈을 바짝 디려대고 끔벅어린다 그리고 우는 소리가 잃어버린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그런 게집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번이 홀애비의 몸으로 얼굴 똑똑한 안해를 맞어다가 술장사를 시켜보고자 벼르든 중이었다. 그래 이번에 해보니까 장사도 잘 할 뿐더러 안해로서 훌륭한 게집이다. 참이지 몇일 살아밧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착착 부닐고 정이 붓는 게집은 여지껏 내보지못했다. 그러기에 나두 저를 위해서 인조(견)으로 옷을 해입힌다 (갈)비를 디려다 구어먹인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었겠느냐. 덧돈을 디려가면서라도 찾을랴 하는것은 저를 보고싶어서 그럼이지 내가 결코 복만이에게 돈으로 물러달랄 의사는 없다. 그러니 아무 염녀말고
「복만이 갈듯한 곳은 다좀 아르켜주」놈의 말투가 또 이상스리 꾀는걸 알고 불쾌하기가 짝이 없다. 아무 대답도 않고 묵묵히 앉어서 담배만 빠니까
「같은 날 같이 없어진걸보면 둘이 짜구서 도망간게아니유?」
「사십리식 떨어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짜구말구 한단 말이유?」
내가 이렇게 펄쩍 뛰며 핀잔을 줌에는 그도 잠시 낙망하는 빛을 보이며
「아니 일텀 말이지 내가! 복만이면 즈안해가 어디간것쯤은 알게아니유?」
하고 꾸중 만난 어린애처럼 어리광쪼로 빌붓는다. 이것도 사랑병인지 아까는 큰체를하든 놈이 이제와서는 나에게 끽소리도 못한다 항여나 여망있는 소리를 드를까하야 속달게 나의 눈치만 글이다가
「덕냉이 큰집이 어딘지 아우?」
「우리 삼촌댁도 덕냉이 있지유」
「그럼 우리 오늘은 도루 나려가 술이나 먹고 낼 일즉이 가치 떠납시다」
「그러기유」
더 말하기가 싫여서 나는 코대답으로 치우고 먼 서쪽 하눌을 바라보았다. 해가 마악 떨어지니 산골은 오색 영농한 저녁노을로 덮인다 산 봉우리는 수째 이글이글 (끓)는 불덩어리가 되고 노기 가득찬 위엄을 나타낸다 그리고 낮윽이 들리느니 우리 머리우에 지는낙엽소리!
소장사는 쭈그리고 눈을 감고 앉었는양이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모양이다. 마는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복만이는 덕냉이 즈 큰집에 있을것 같지않다.
(을해, 二(이), 八(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