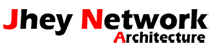복만이가 저녁에 우리집에 왔을 때에는 어서 먹었는지 술이 건아하게 취했다. 안뜰로 들어오드니 막걸리를 한병 내놓며
「이거 자네 먹게」
「이건 왜사와 하튼 출출한데 고마워이」하고 나는 부엌에 나려가 술잔과 짠지쪽 아리를 가주나왔다. 그리고 둘이 봉당에 걸터앉어서 마시기 시작하였다.
술 한병을 다 치고나서 그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지꺼리드니 내앞에 돈 일원을 끄내놓는다.
「저번 수굴 끼쳐서 그옐세」
「예라니?」
나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 얼굴을 이윽히 처다보았다. 마는 속으로는 요전 대서로로 주는구나 하고 이쯤 못깨다른 바도 아니었다. 남의 안해를 판 돈에서 대서료를 받는것이 너머 무례한 일인것쯤은 나도 잘 안다 술을 먹었으니까 그만해도 좋다 하여도
「드구 술사먹게 난 이거 말구두 또있으니까!」하고 구지 주머니에게까지 넣어주므로 궁하기도 하고 그대로 받아두었다. 그리고 그 담부터는 복만이도 영득이도 우리 동리에서 볼수가 없고 그뿐 아니라 어디로 가는걸 본 사람조차 하나도 없다.
이런 복만이를 소장사 이놈이 날더러 찾아놓라고 명영을 하는것이다. 멱살을 숨이 갑갑하도록 바짝 매달려서 끌려가자니 마을 사람들은 몰려서서 구경을 하고 없는 죄가 있는듯이 얼굴이 확확 단다 큰 개울께까지 나왔을 적에는 놈도 좀 열적은지 슬몃이 놓고 그냥 거러간다 내가 반항을 하든지해야 저도 독을 올려서 욕설을 하고 겼고틀고 할텐데 내가 고분이 달려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저의 원대로 주재소까지가기만하면 고만이니까
우리는 아무 말없이 앞스고 뒤스고 십리길이나 걸었다 깊은 산길이라 사람은 없고 앞뒤 산들은 울긋붉긋 물들어 가끔 쏴 하고 낙엽이 날린다. 누였누였 넘어가는 석양에 먼 봉우리는 자줏빛이 되어가고 그 반영에 하늘까지 볼콰하다. 험한 바위에서 있다금 돌은 굴러나려 웅덩이의 맑은 물을 휘저넣고 풍 하는 그 소리는 실로 쓸쓸하다 이산서 숫꿩이 푸드득 저산서 암꿩이 푸드득 그리고 그 사이로 소장사 이놈과 나와 노량으로 허위적허위적
또한 고개를 놈이 뚱뚱한 몸집으로 숨이 차서 씨근씨근 올라오니 그때는 노기는 완전히 사라젔다. 풀밭에 펄석 주저앉어서는 숨을 돌리고 담배를 끄내고 그리고 무슨 마음이 내켰는지 날더러
「다리 아프겠수. 우리 앉어서 쉽시다」하고 친절히 말을 붙인다. 나도 그 옆에 앉어서 주는 권연을 피며 물었다. 인제도 주재소까지 시오리가 남었으니 어둡기전에는 못갈것이다.
「아까는 내 퍽 잘못했수」
「별말 다하우」
「그런데 참 복만이 간데 짐작도 못하겠수?」
「아마 몰음몰라두 덕냉이 즈 큰집이 갔기가 쉽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