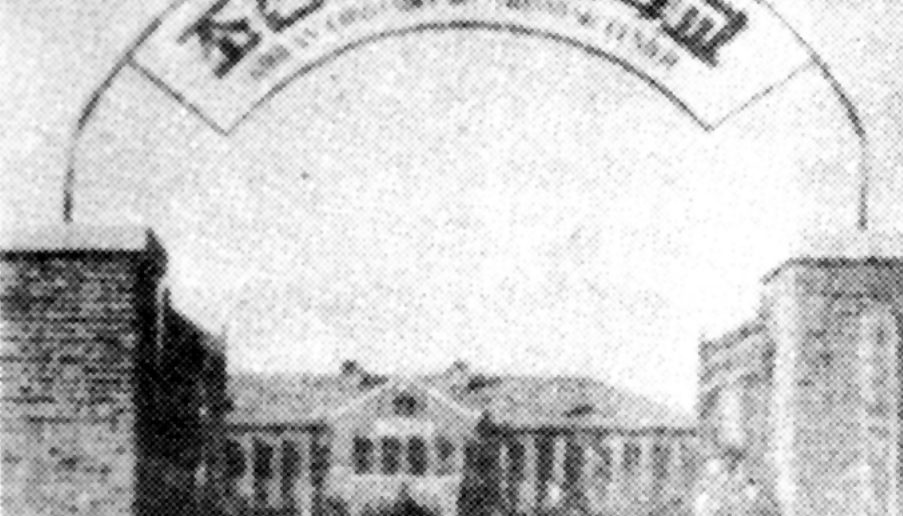경비사관학교 생도대장 폭행사건은 1946년 12월 4일 밤에 생도대장이면서 경비사관학교 교장 대리를 겸하고 있던 이치업(李致業) 대위가 자신의 숙소에서 취침 중 사관후보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의식불명에 이르렀던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경비사관학교는 제2대 교장이었던 원용덕(元容德) 중령이 춘천의 제8연대장으로 전임한 상태라 생도대장인 이치업 대위가 교장 직무 대리를 겸하고, 김형일(金炯一) 대위가 A중대장, 오일균(吳一均) 대위가 B중대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경비사관학교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간에 군사교육의 경험, 연령, 그리고 학벌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간부들은 후보생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민간인 출신들의 경우에 정규 군사경력이 없었을 뿐, 중학교 시절에 학도군사훈련(學徒軍事訓練)을 받았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의 교육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비사관학교의 교육방침은 후보생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후보생들은 경비사관학교라는 이미지에서 한국군 장교로서의 교육과 한국적인 예의범절을 기대하고 입교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관학교 수뇌부는 대부분 교관 교육을 받지 않고 일본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후보생 교육은 기합 위주의 일본군식 교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교육 내용도 제식훈련, 99식 · 38식 소총의 취급법과 사격, 독도법, 분대와 소대전투 등으로 이루어져 경험을 가진 후보생들에게는 진부한 것이었다. 게다가 사관후보생으로서의 대우가 형편없었던 점도 후보생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특히 주․부식(主副食) 문제로 인해 후보생들의 불만이 컸다. 1946년에는 홍수로 인한 수해와 농지개혁의 미비점 등이 겹친 데다가 비료와 농기구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전례없는 큰 흉작이 들었다. 일반가정에서조차 좀처럼 쌀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쌀의 타도반출(他道搬出)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식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대용식(代用食)으로 고구마를 구입하여 식사 때마다 2~3개씩 주었고 1주일에 쌀밥 한두 번 먹기가 힘들었다. 20대의 청년들이 하루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고구마 2~3개로 배를 채운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이렇듯 식량사정의 어려움과 사관양성의 뚜렷한 이념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후보생의 훈련과 생활을 담당하던 생도대장과 구대장(區隊長)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본군대의 통솔개념에 의거해 후보생을 통솔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후보생들의 경우, 나름대로 사관학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이러한 이념문제와 생도대장의 통솔에서 빚어진 갈등이 일부 과격한 후보생들을 자극하여 급기야 한밤중에 생도대장을 습격하여 얼굴을 뒤집어씌우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구타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5월의 제1연대, 6월의 제4연대, 10월의 제3연대에서 발생한 하극상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좌익 사상을 신봉했던 것으로 보이는 B중대장 오일균과 교관 조병건(趙炳乾)같은 사람들의 감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1949년에 있었던 숙군 과정에서 제2기생이 무려 17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생도대장 폭행에 가담한 생도들은 유유히 내무반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범인은 좀처럼 알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1주일쯤 지난 뒤에 서모라는 후보생을 비롯해 5~6명의 후보생이 가담했던 것으로 판명되어 가담자는 퇴교 처분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폭행 가담 후보생의 퇴교조치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생도대장이 구타를 당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경비대가 처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