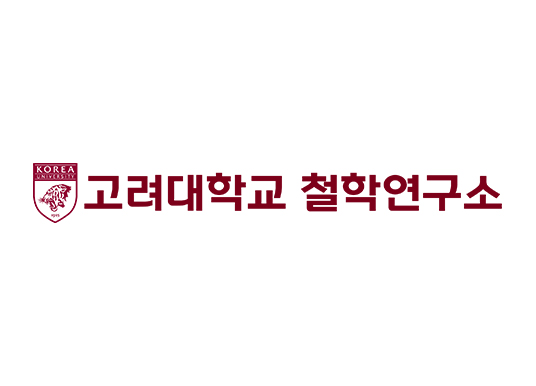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인과론에서 무의식
The Unconscious in the Theory of Causality of Kant and Schopenhauer
이 논문은 칸트의 인과론을 무의식의 차원과 연결하여 고찰 함으로써 흄의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선험철학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시 도이다. 이를 위해 인과율을 사물의 본질과 연관된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칸트의 인과론과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인과개념에 대한 흄의 분석 이후에 인과율은 대체로 사물의 본질과 관련 없는 규칙적 결합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칸트의 선험적 관념 론도 인과율이 사물의 본질에 적용될 수 없다는 회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흄의 관점과 다르지 않다. 칸트가 인과율에 대한 흄의 회의주의를 인식 주체의 능력을 통해 극복하려고 시도한다는 해석은 동시 대 철학자들에게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칸트는 우리가 지성의 개념으로 객관적 지식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다. 그는 규칙을 위한 조건이 객체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경험적 직관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 히 주어진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인과율의 선천성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쇼펜하우어는 감각이라는 결과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인과범주가 무의식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칸트는 감각이 객체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지만, 지각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범주의 적용이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표현한다. 따라서 칸트의 인과론에서도 인과범주의 무의식적 적용을 통해 사물의 본 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인식이 성립할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transcendental philosophy that overcomes Hume’s skepticism by examining Kant’s causality in connection with the dimension of the unconscious. To this end, it compares and examines Schopenhauer’s view that extends the law of causality to the realm of the unconscious related to the essence of things with Kant’s causality. After Hume’s analysis of the concept of causality, causality is generally thought to refer regular associati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nature of things.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is not different from Hume’s view in that it cannot escape the skepticism that causality cannot be applied to the essence of things. The interpretation that Kant attempts to overcome Hume’s skepticism about causality through the ability of the subject of cognition has been widely accepted from contemporary philosophers to the present, but Kant does not claim that we construct objective knowledge with the concept of understanding. He emphasizes that the conditions for rules must be placed on objects. Schopenhauer criticizes Kant for not being able to prove causality by simply asserting that empirical intuition is given without explaining the process by which it occurs. Schopenhauer explains that causal categories are unconsciously applied in the process of finding the cause of the result called sensation. Although Kant does not discuss the process by which sensations are transformed into the knowledge of objects, he expresses in many places that the application of categorie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perception is unconscious. Therefore, in Kant’s theory of causality, metaphysical knowledge of the essence of things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unconscious application of causal categories.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철학연구소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