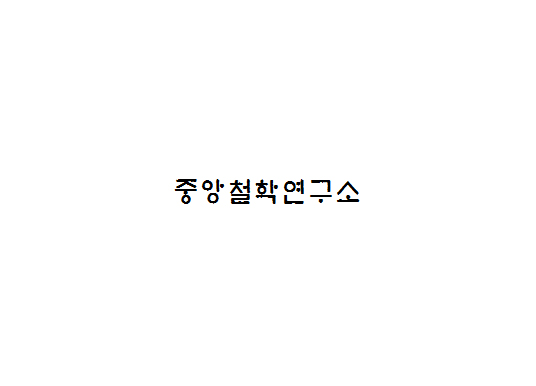집단적 감정과 연대의식: 집단적 감정의 도덕적 정당화 문제
Collective Emotion and Solidarity: The Moral Justification of Collective Emotion
이 논문은 집단적 감정, 특히 집단적 죄책감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Larry May는 야스퍼스의 형이상학적 죄책감 개념을 바탕으로 집단적 죄책감을 부정하고, 개인의 무 행동에 대한 수치심만을 인정한다. 반면, Margaret Gilbert는 복수 주체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공동 헌신을 통해 하나의 집단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성원이 집단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이 이론들이 가진 한계—예컨대 감정의 자발성 문제와 이론의 순환성—를 지적하며, P. F. Strawson의 반응적 태도 개념을 통해 집단적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응적 태도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성원이 직접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집단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감정(예: 타인의 반응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죄책감과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감정으로서 의분 등)을 느끼는 것은 정당하며, 이는 연대의식과 도덕적 책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philosophically explores whether collective emotions—particularly collective guilt—can be morally justified. Larry May, drawing on Karl Jaspers’ concept of metaphysical guilt, denies the validity of collective guilt and instead recognizes only individual shame for inaction. In contrast, Margaret Gilbert argues, through her plural subject theory, that individuals can form a collective moral agent through joint commitment, thereby making it possible for members to feel guilt over a group’s wrongdoing. I critique both theories for their limitations—such as the problem of emotional voluntariness and conceptual circularity—and proposes P. F. Strawson’s theory of reactive attitudes as an alternative. If we accept the theory of reactive attitudes, it is justifiable for members of a group to experience moral emotions—even if they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wrongdoing—such as guilt as an individual attitude toward others’ responses, and indignation as a collective emotion toward injustice. These emotions can form the core of solidarity and moral responsibility.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