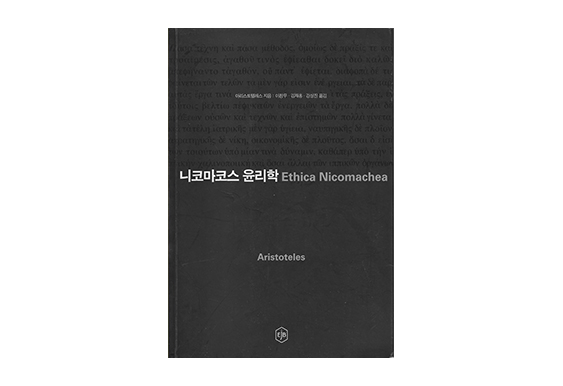agathon — 좋음, 좋은 것, 뛰어난(것), 탁월한(것), [기존 번역어: 선]
원어 ‘아가톤(agathon)’은 라틴어의 ‘bonum’에 해당하며 영어를 비롯한 인도유럽어족에서는 ‘good’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좋음 자체’와 같은 추상적인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번역이 매꾸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해석이 가능한 개방적인 번역어 ‘좋음’을 표준 번역어로 번역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외적인 좋음들(external goods)’이라고 열거하는 명예나 외모, 좋은 가문과 같은 것들은 일단 ‘좋은 것들’의 한 범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좋음이 도덕적 좋음이 아니라는 것은 명심해 줄 필요가 있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유연성에서 보면 ‘선(善)’이 적합한 번역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에서 ‘선’은 ‘좋음’보다 비교적 좁은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우리말에서 ‘좋은 의자’나 ‘좋은 집’이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선한 의자’나 ‘선한 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가톤’은 한 사물을 한 사물이게끔 해 주는 기능이나 본성의 ‘탁월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책상을 잘 만드는 것처럼 목수 일의 기능이나 본성이 완성된 사람, 달리 말해 목공을 지속적으로 늘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수 내지는 탁월한 목수이듯이, 인간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한 기능이나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할 만큼 완선된 품성상태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인간 내지는 탁월한 인간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기능이나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혐할 수 있는 품성상태라는 의미로 ‘탁월성(aretē)’을 이해할 수 있다. 좋은 사람, 혹은 탁월한 사람은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말에서 ‘선한 사람’ 이라고 하면 실현해야 할 기능이나 본성에 대한 준거 없이 그저 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인간’ 과는 거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이제이북스(2006), p45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