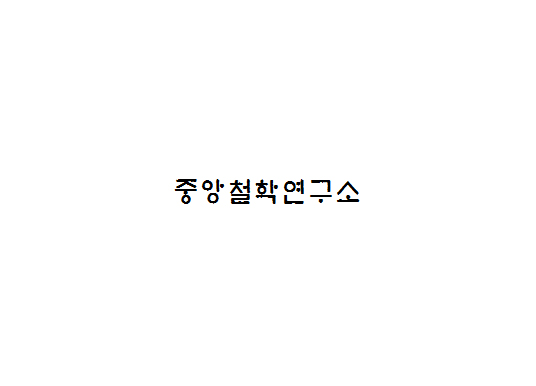메이야수의 사변에서 상관주의와 거대한 외계(Grand Dehors)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Compatibility of Correlationalism and Grand Dehors in Meillassoux’s speculation
사변적 실재론이 연구자들의 복잡성에도 상관주의를 거부한다는 공통점에서 하나의 학적 경향으로 묶일 수 있다면, 퀑탱 메이야수(Quentin Meillassoux)가 현대 실재론의 문제의식 중심에 있는 학자라는 게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 기원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메이야수에 대한 평가는 ‘상관주의적’ 층위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며, 심지어 상관성의 세계란 전혀 불필요한 영역인 것처럼 회자된다. 이 글의 목표는 ‘거대한 외계’로의 사유 가능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메이야수에게 상관성의 세계가 필요함을 보임으로써 ‘상관주의 비판’이라는 축소된 이미지로부터 그의 전체적 논의를 해방시켜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광막한 외부’ 개념과 메이야수의 ‘거대한 외계’ 개념을 함께 다뤄보는 작업은 유의미할 것이다.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도식을 두고 분리의 부재라는 공통된 비판 의식에서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 바깥은 절대 없다고 피력하는 라투르와 절대적 바깥으로의 출로를 뚫는 메이야수의 귀결은 상호배타적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가 메이야수의 표면적 오독에서 벗어난다면, 양자를 함께 논의할 여지가 생길뿐더러 인간의 ‘내부-외부’ 경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문제 설정 역시 생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Quentin Meillassoux is surely core to Speculative Realism because it is in terms of rejecting Correlationism. According to emphasized a role of origin, however, the evaluation of him tends to remain only at the correlational level. Even more seriously, there are all sorts of rumors for him a whole area of correlation is destined as if it were a completely unnecessary.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Meillassoux needs the world of correlatin in the process of seeking the possibility of thoughts of the Grand Dehors, thereby liberating his entire discussion from the reduced image of criticism of correlationism. To this end, If we escape from the superficial misinterpretation of Meillassoux, not only there be room to discuss two together, but we will also be able to create a profound problem setting regarding the boundary betwee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of humans.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윤단비